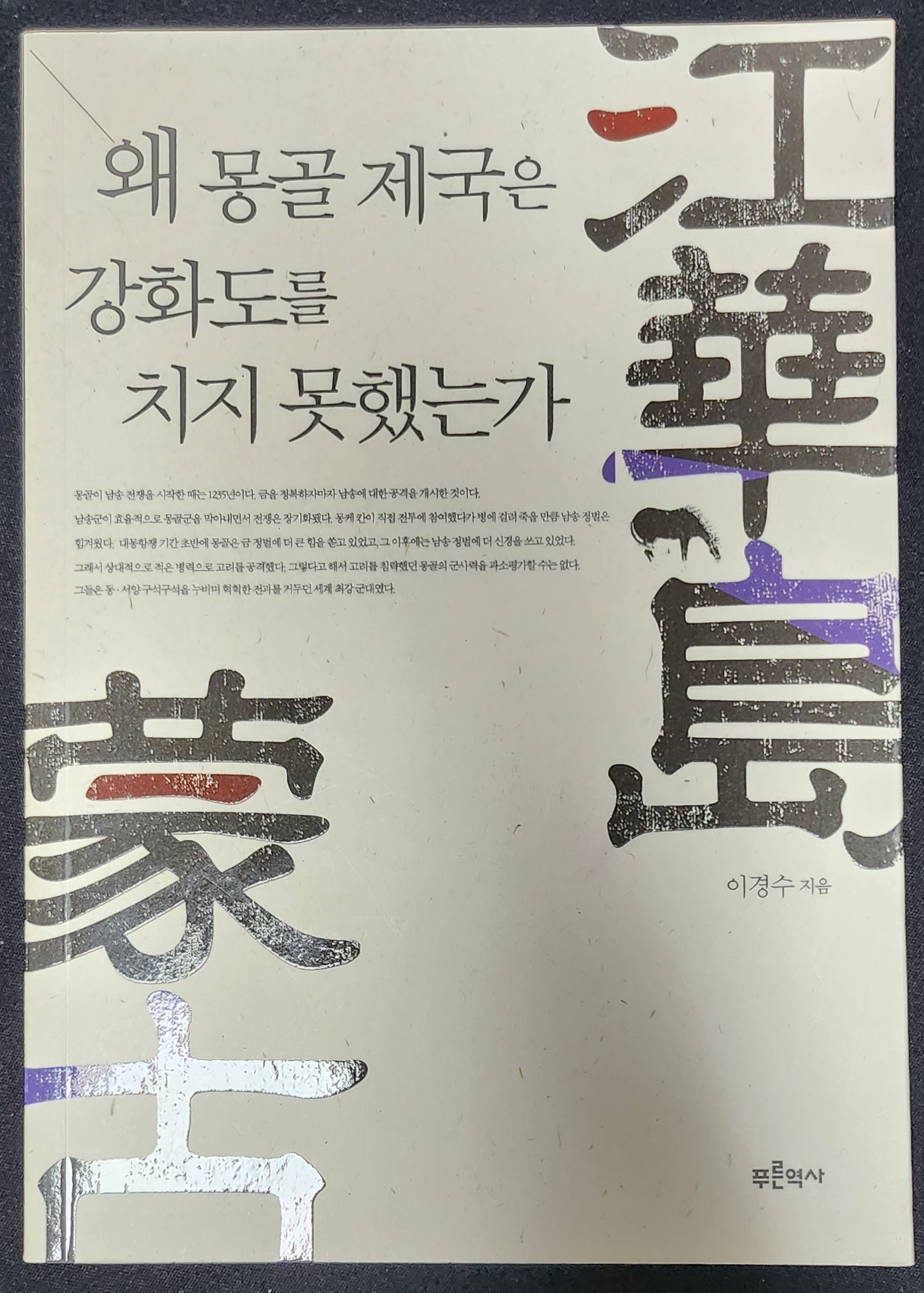
머리말 중에서
“동서양 많은 나라가 몽골이 쳐들어가자마자 무너졌습니다. 버텨낸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고려는 수십 년 항쟁을 계속하며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이 책에 고려시대 대몽항쟁對蒙抗爭의 다양한 모습을 담았습니다. ‘백성의 힘’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항전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찾아갑니다.
대몽항쟁 기간 고려의 도읍지였던 강화도의 존재에 주목합니다. 몽골군은 전 국토를 짓밟았지만, 고려의 심장부인 강화도는 한 번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정이 오롯이 유지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끈질기게 항쟁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몽골군이 강화를 치지 못한 이유가 뭘까? 강화군과 김포시를 잇는 강화대교 길이가 700미터에 불과합니다. 한강 다리들보다도 짧습니다. 아무리 물을 무서워한다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 좁은 바다를 왜 못 건넌 걸까? 몽골군은 정말 수전水戰 능력이 없던 것일까? 강화도를 치지 못한 것인가, 치지 않은 것인가? 이제 궁금증을 풀어갑니다.”
〈한국일보〉 서평
"물을 겁낸 몽골에 강화도는 공략 힘든 요새였다"
1231년 7월 고려의 23대 임금 고종은 도읍지인 개경을 버리고 바다 건너 강화도로 들어갔다. 몽골 장수 사르타크가 압록강을 건넌 지 11개월 만이었다. 그리고 38년 뒤 아들인 24대 원종이 개경으로 환도하기까지 고려의 사직은 작은 섬 속에 갇혔다. 이 사실에서 한 가지 의문이 파생한다. '하지 못했던 것일까, 하지 않았던 것일까.'
한달음에 바그다드와 발칸반도 내륙까지 무너뜨렸던 대제국 몽골이 좁은 강화도 해협을 앞에 두고 40년 가까이 고려와 대치했다는 사실은 설명해내기가 쉽지 않은 역사학계의 해묵은 논쟁 거리다. 과거엔 그것을 우리 겨레붙이의 강건함을 증명하는 에피소드로 동원하는 일이 잦았다. 그러나 몽골이 강화도를 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치지 않았다는 것이 현재 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몽골은 대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강과 바다를 숱하게 건넜고 수전도 치러낸 경험이 있다. 남송(南宋)과 고려를 상대로 동시에 정복전쟁을 해야 했던 몽골이 전략적 판단에 따라 강화도를 놓아둔 것이지, 결코 능력이 없어서 바라만 보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책은 그러나 정반대의 주장을 담고 있다. 이렇게 간명하게 요약할 수 있겠다. "아니다. 몽골은 물을 겁냈다. 몽골은 강화도를 치지 못했다!"
지은이는 현직 고교 역사 교사다. 강화도에서 나고 자라 김포에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책의 곳곳에 강화도 또는 우리 역사에 대한 애정과 자부가 묻어난다. 감안하고 읽는 것이 좋겠다. 이 책은 합리적인 역사 접근의 방법, 곧 사료에 바탕을 두고 꼼꼼히 고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객관적 분석의 대상으로서 엄밀하게 역사를 대하는 성격의 책과 분명 거리가 있다. 취합한 자료와 취재한 내용의 외연은 지은이의 주장과 부합하는 범위 내로 한정된다. 군데군데 감상과 결합한 추측도 눈에 띈다. 역사를 다루는 책으로서 그것은 한계가 될 텐데, 반대로 그러한 특징이 독서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한다. 진지한 역사서보다는 대중적 교양서로 읽는 것이 옳을 듯하다.
지은이는 여러 선행연구로부터 몽골군이 물을 무서워했다는 정황을 끌어온다. 13세기 칭기즈칸은 부족을 통일한 뒤 몽골의 법률인 '대야사'를 제정하는데 여기서 몽골이 물과 관련해 유독 엄한 터부나 규정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몽골이 남송과의 수전에서 승리한 시점이 이미 한족의 상당수를 복속시킨 뒤여서, 수전에 투입한 병력이 몽골족이 아닌 이민족이었을 것이라는 연구도 인용한다. 고려가 우리 수역의 전투에 적합한 전선을 개발해 보유하고 있었다는 해양 발굴조사도 당시 몽골군에게 강화해협을 건널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돼 준다.
강화해협의 물살이 급하고 기마군에게 치명적인 갯벌이 넓다는 사실, 고려가 강화도에 3중의 성곽을 축조해 두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몽골이 강화도를 건너지 못했던 이유로 짚어진다. 최씨 무신정권의 독재라는 정치적 상황도 일사불란한 농성을 가능하게 했다. 요컨대 13세기 강화도는 제아무리 기습에 능한 몽골군이라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요새였다는 것이다. 몽골이 '봐줘서' 우리가 대몽항쟁기 자주권을 지킬 수 있었다는 일반론에 맞서 주체적 시각을 웅변하는 책.
〈한국일보〉 2014.03.15. 유상호 기자



